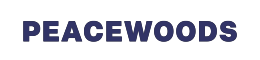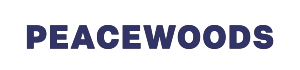진묵조사는 조선의 대 선승으로 민중들이 살아있는 부처로 믿으며 따랐으며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묵은 1562년 김제군 만경면 불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일옥입니다.
일옥이 태어날 무렵 3년 동안이나 풀과 나무들이 시들자 사람들은 큰 인물이 날 징조라 했습니다. 일옥은 어릴 때부터 비린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이 어질고 총명하여 마을에서는 불거촌에 생불이 태어났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5살에 여읜 일옥은 7살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전주 서방산에 있는 봉서사로 출가했습니다. 서방산은 ‘서방정토’ 즉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서방산 산봉우리들이 양쪽으로 휘감은 자락 안에 봉황이 깃든다는 봉서사가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봉서사 주지 대월 화상이 칠순을 갓 넘긴 희 노장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밤에 석가모니불께서 천 이백 대중을 거느리시고 우리 절에 올라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허, 아주 좋은 꿈을 꾸셨소.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대중들은 마음이 설레어 도량을 쓸고 대웅전 큰 법당에서 예불을 드렸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대웅전 마당에 칠팔 세 되는 동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은 일옥이고 일곱 살 먹었습니다.”
“어디서 온 동자인고?”
“네, 저의 집에서 왔지요.”
대중들은 웃으며 겨우 일곱 살 된 아이가 왔다고 떠들며 뿔뿔이 자기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지스님과 희 노장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가 일주문까지 데려다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고?”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느냐?”
“스님은 숨 쉬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고 아셨는지요?”(계속)
진목조사(2)에서 이어집니다.